선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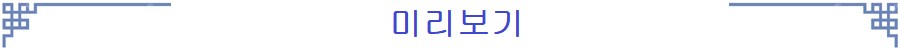
옛날 옛적에
1.
비더는 오늘도 사방팔방을 헤매며 떠돌아다닌다. 세상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든 것이 혼돈스럽기만 하다. 뭔가가 그립지만 뭐가 그리운지도 모르겠고,왠지한이 맺힌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왜 그런지도 몰랐다.
비더의 방황은 한도 끝도 없는 듯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 도 없다. 아무도 자신에게 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가...’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하루가 지나고 또 다시 다른, 영원한 것 같은 하루가 지나가기를 반복을 한다. 그런 하루가 몇 천 번, 몇 억 번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비더의 삶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아무런 새로움도 변화도 없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혼돈의 나날이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는 날 부터, 왠지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없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오자, 몸이 공기 중의 먼지처럼 붕 떠서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리움 대신, 이번에는 뭔가를 열심히 찾는 듯했다. 하지만,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도 몰랐고, 정처도 목적지도 없는 것은 여전했다.
‘내가 뭘 찾고 있지?’
‘치매라도 걸렸나?’
비더의주위에는 누군가가 있었지만 동시에비더는 항상 혼자였다.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 영원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2.
비더는 오늘도 잠에서 깨어났다. 적어도 비더는 자신이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
‘눈을 뜨기도 귀찮아.’
비더는 영원 같은 시간 속에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무료함을 느꼈다.
비더가 잠을 고집하며 누워있을 때, 이상하게도, 한 맺힌 느낌이 사라지는 듯하더니 땅에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갑자기 자신의 몸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곧이어, 온통 사방이 갑자기 젖은 느낌이 들었다. 그토록 영원할 것 같던 혼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비더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분명히 물은 아닌데?’
비더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불을 적셨나?’
비더가 자신을 위로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순식간에 타버릴 정도로 뜨거운 불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았다.
“앗, 뜨거워!”
자동적으로 눈이 떠졌다.
‘아까 눈을 분명히 뜨고 주위를 봤었잖아?’
비더는 어느 것이 착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갔다.
비더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열탕에 있는 것처럼 김이 가득해서 시야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윽고, 하얀 김으로 가득 차 있던 주위가 어느 새 칠흑처럼 깜깜해졌다. 세상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마치 소리란 존재하지 않는, 입구나 출구가 없이 꽉 막힌 암흑의 터널 속에 있는 듯했다.
비더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런암흑은 본 적이 없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야...”
“무시무시하게 짙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막연하지?”
비더는 자신의 목소리라도 들어야지만 안심이 될 것 같았다.
암흑의 터널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때, 비더는 일정한 주기로 울리는 박동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암흑 속에서 들렸어. 맞지?”
“맞아!”
비더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답변을 한다.
그러다, 비더가 질겁을 한다. 암흑으로 아무런 구분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뭔가가 움직인것같은데...”
“뭔가가 움직였지?”
“봤지?”
“내가 본 거 맞지?”
비더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떴다. 귀로 들은 소리인지, 시야에 포착된 움직임인지 조차 분간이 안 갔기 때문이다.
“진동인가?”
비더는 벽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손을 뻗어보았다. 하지만, 아무 것도 만져지는 것이 없었다. 비더는 발을 굴러 보았다. 하지만, 발에도 아무런 감촉이 없었다.
“내가 떠 있는 건가?”
그리고 비더는 갑자기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 다시 커다란 진공청소기가 밑에서 자기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좁디좁은 틈을 타고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중심도 못 잡고, 위아래 방향감각도 잃어버리고 벽에 긁히면서 뒹굴고 있을 때 갑자기 세상이 넓어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자신의 몸을 미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귀를 찌르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귀가 멍멍해졌다. 그러기도 잠시, 땅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워졌다. 비더는자신도 모르게 용수철처럼얼른 일어나졌다.
“불구덩이야!”
3.
그러고 보니 이번에는 뭔가가 보였다. 뜨거움을 피해서 뛰어다니는 수많은 인간들이 한편에 몰려 있었다. 그들은뛰어다니다가 비더와 부딪히고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비더를 째려보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해댔다.
하지만, 비더는 개의치 않았다. 자신의 존재감까지 의심을 하고 있던 비더에게는 저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도 소화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새로웠다.
비더는 설레임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명히 더 좋은 곳일 거야.’
하지만, 설레임도 잠시, 비더는 바닥이 뜨거워서 한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계속 발을 바꿔가면서 걸어야만 했다.
비더가주위를 둘러보기 위해서 한 발자국 띄자마자 주위는 갑자기 한 치의 틈도 없이 빽빽해졌다. 착 달라붙어 하나의 무리가 된 이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서로 밀고 밀리면서 끊임없이 계속 발을 바꿔가면서 돌고 있었다.
어떤 이는 다른 이들의 머리나 어깨를 밟고 올라가 있었고, 어떤 이는 밑바닥에 쓰러진 채로 다른 이들의 발판이 되고 있었다. 그 뜨거운 발판에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도 쓰러진 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았다. 서로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아우성이었기 때문이다.


黃土白空황백 ⓒ All Rights Reserved
